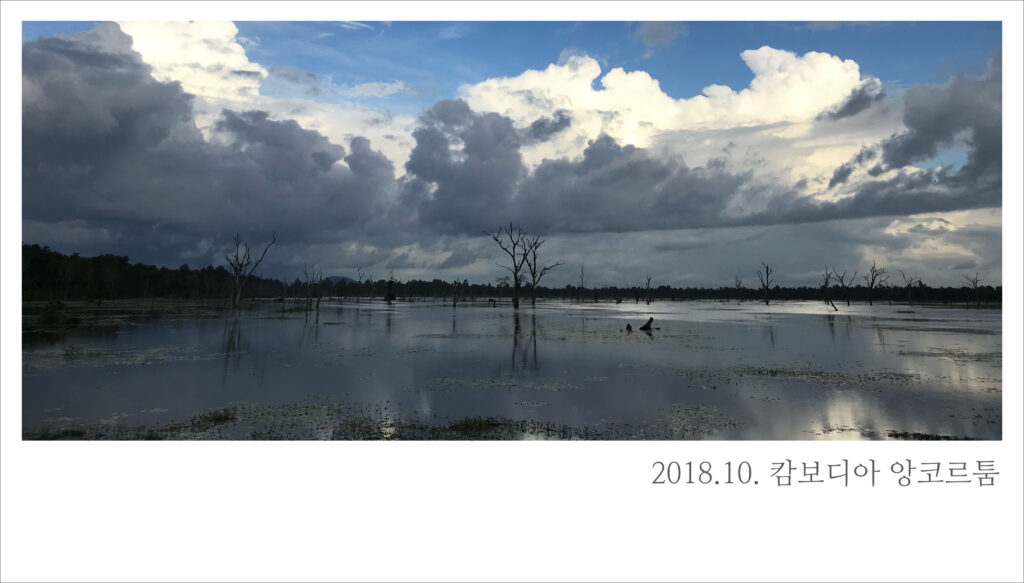
며칠 전 꿈을 꾸었다. 이하는 꿈 내용.
난 지쳐있었다. 재미없는 삶, 뭔가 재밌는 일 없을까 갈급한 마음만 드는 삶. 그런 일상에서 도망치고 싶었다. 마침, 지구를 떠나 태양계를 벗어날 예정인 우주선이 있길래 몰래 탑승했다. 일단 지구만 뜰 수 있다면, 가는 도중에 내쫓을 순 없겠지 싶었다. 설마 나 하나 때문에 지구로 되돌아올 리가 있겠나.
로켓에 불이 붙고 우주선이 떠오르자 나는 환호했다. 됐다.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다. 수학여행 가기 전날 도파민 터지던 느낌,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는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에 느꼈던 그 설렘, 그런 느낌으로 평생을 살리라는 기대감이 팡팡 터졌다.
그러나 우주선이 곧 태양계를 벗어나자, 금세 겁이 나기 시작했다. 전면 통창이 난 우주선 밖으로 보이는 우주는 시커멓게 속이 보이지 않았다. 거대한 팬이 위협적인 웅웅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대관령 풍력발전기 밑에 서 있던 느낌 같았다. 어둠이 너무나 거대하여 내가 먼지 한 톨처럼 느껴지는 느낌이었다. 밤중에 학교 복도에 깔린 어둠 너머에서 알 수 없는 공포가 밀려오듯, 온몸이 떨려 주저앉고 싶을 지경이었다. 세상에 만만한 건 없었다. 그냥 지구에 있을걸. 뭐가 나올지,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는 금세 눈을 감아 버렸다.
마침, 우주선이 잠깐 지구를 스쳐 갈 일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됐다. 너무 잘 됐다. 중간에 내려야겠다 싶었다. 곧 우주선 창문 너머로 지구가 보였다. 그러나 곧 걱정이 몰려왔다. 스쳐 지나간다는 게 어느 정도지? 지구가 축구공만 하게 보이는 정도에서 스쳐 지나가는 거라면 내릴 수가 없는데! 설사 대기권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, 그냥 뛰어내리면 죽는거 아닌가! 설사 더 지표면 가까이 내려와 준다고 하더라도, 바다를 지나가는 거라면 뛰어내려도 죽는 거 아닌가. 설사 육지에 뛰어내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른 나라면 집에 어떻게 가지? 카드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! 옛날에 속도를 줄이던 학원 버스에서 뛰어내렸던 기억이 났다. 30km/h 즈음으로 매우 속도를 줄인 상태라 만만하게 보고 뛰었지만, 바닥에 다리가 닿자마자 데굴데굴 구른 끝에 만신창이가 됐던 기억이었다. 잘못 뛰어내리면 죽는다.
우주선은 다행히 육지로 접근했다. 우주선은 너무나도 다행히 더 내려가기 시작했다. 우주선은 너무 너무나도 다행히 파라솔이 내 몸만 하게 보일 정도로 가까이 내려갔다. 너무 너무나도 다행히 해수욕장에 꽂힌 국기가 보이기 시작했다. 태극기가 무수히 꽂혀 있는 게 보였다. 한국이네. 우주선은 더욱 하강하여 이제 1미터 정도만 남겨놓고 10km/s 이하로 속도가 늦어졌다. 이때다! 뛰어내렸다. 데굴데굴 구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릎도 안 아프게 무사히 착지했다. 아~ 지구다~ 대한민국이다.
미칠듯한 안도감이 물에 풀은 잉크처럼 온몸에 퍼져감과 동시에 번쩍 깨어났다. 깨어나자마자 생각이 들었다. 삶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. 이 땅에서 발 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. 파랑새는 여기에 있다. 우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! 안도감과 감사함으로 몸부림치면서 물 마시러 밖에 나왔다. 끝.